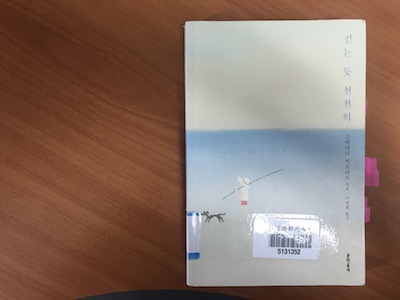걷는 듯 천천히
걷는 듯 천천히 / 고레에다 히로카즈
지난 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을 읽고선 아주 푹! 빠져버렸다.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 것 투성이였다.
더 이전에 쓰인 걷는 듯 천천히를 나중에 읽게되었다. 덕분에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과 겹치는 내용이 일부였지만 이 사람, 정말 이 부분에선 이렇게 고집스레 생각했구나 란 생각에 나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세 번째 책에서도 반복된다면 좀 다시 생각해볼 것 같지만.)
‘걷는 듯 천천히’를 보기 전에 그의 영화 ‘걸어도 걸어도’를 봤다. 덕분에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을 읽을 때와는 약간의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 많은 변화는 아니었고, 그가 그의 부모님에 품은 생각을 재고해보는 정도.
얼른 그의 신작 만비키 가족을 보고싶단 생각을 내내 했다. 물론 아직 보지 못한 그의 전작들도 천천히 모두~! 시간을 가지며 천천히 보고싶은 마음과 얼른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다투느라 정신이 없다.
좋았던 구절 몇 가지.
p.9
보편성이란 무엇일까? 물론 무언가를 만들 때 전 세계를 고려한다고 해서 세게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의 내면적 체험과 감정을 탐구해서 어떤 종의 보편에 닿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당분간 그런 자세로 나와, 영화와, 세계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p.22
“당신은 영화 속의 어떤 등장인물도 판단하려 들지 않는다.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 지점이 나루세 미키오 감독의 영화와 통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좀 자랑이다. 그렇긴 하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왜 내가 나루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알게 됐다.
p.25
감정이 형태를 가지려면, 영화로 치면 영화 밖의 또다른 한 가지, 자신 이외의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감정은 그 외부와의 만남이나 충돌에 의해 생긴다. 어떤 풍경을 마주한 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름다움이란 내 쪽에 있는가, 아니면 풍경 쪽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세계를 생각하는가, 세계를 중심에 두고 나를 그 일부로 여기는가에 따라 180도 다르다. 전자를 서양적, 후자를 동양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후자에 속한다.
p.86~88
‘지가사키관’이라는 낡은 여관에 묵고 왔습니다. 1899년에 창업한 이 여관은 쇼난 해안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분위기로 서 있습니다. 그 옛날, 영화감독 오즈 야스지로가 극본가 노다 고고 등과 장기 체류하면서 <초여름>과 <만춘> 그리고 <동경이야기>의 각본을 집필한 곳인데, 일부 영화팬에게는 성지같은 장소입니다.
(중략)
아침엔 천장 높은 목욕탕에서 목욜을 하고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엔 방에 틀어박혀 오직 원고지와 마주합니다. 5월이었으니 아직 바다를 즐기는 투숙객도 없고 대부분 장기 투숙인 상태. 무엇보다 밤이면 어두운 중정의 저편에서, 낮에는 들리지 않던 파도 소리가 울려옵니다. 이 소리를 오즈 씨도 들었을까 생각하니 역시 기분이 벅차올랐습니다.
(중략)
<걸어도 걸어도>는 그런 시간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그 영화 속 어딘가에 이때 머물렀던 기억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p.105
영화제 등으로 일주일 정도 해외에 나갔다가 나리타 공항에 돌아온다. 시부야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 너머로 도쿄 타워의 불빛이 보이면 ‘돌아왔구나……’ 하고 안도한다. 사람이 꼭 자연의 풍경으로만 치유되는 것은 아님을, 약간의 쓸쓸함과 함께 실감하는 순간이다.
p.106
단독주택에서 태어나 자란 엄마로서는 정말이지 집합주택이라는 게 편치 않았는지, 계속해서 ‘임시 거처’라고 느꼈던 것 같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단지가 마지막 거처였다. 나도 단지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고, 귀향할 장소를 잃은 지도 벌써 5년째다. 고향이라고 부를 만한 장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쓸쓸함. 내 아이에게 지금 사는 아파트가 훗날 ‘고향’으로 불리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언젠가 그런 감정도 영화에서 그려보고 싶다.
p.121
아내가 남편에게 “저기 누구누구씨, 가위 좀 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로만 읽으면 평범하지만, 실제 방에서 연기해보면 너무 설명적이다. 우선 두 사람밖에 없다면 서로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된다. 눈에 보이는 데 있다면 가위란 단어를 ‘그것’으로 바꾼다. 손가락 두 개를 가위 모양처럼 만들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최종 대사로 “저기"만 남아도 좋다. 그럼으로써 이 한줄의 대사는 리얼한 생활어로 살아나, 결과적으로 공간을 살려낸다.
p.160
가장 많이 반복해서 질문받거나 지적된 점은 “당신은 영화의 등장인물을 도덕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아이를 버린 어머니도 단죄하지 않는다"였다. “영화는 남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감독은 신도 판사도 아니다. 악인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야기(세계)는 알기 쉬워질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관객들이 이 영화를 자신의 문제로서 일상에까지 끌고 들어가도록 할 수 있지 않나싶다"라는 게 내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이클 무어의 자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태도인지도 모른다.